좀 슬프겠단 얘기

당연히 한 곡 반복, 사전에 준비할 건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방안을 어둡게 유지하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명을 켜둘 것. 두 번째, 미리 화장실에 다녀올 것. 세 번째, 티브이는 전원을 끄거나 볼륨을 아주 작게 줄일 것.(개인적으론 후자를 추천한다)
어릴 적 내 별명은 울년이었다.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셨다. 아이고, 우리 울년이 왔나. 울년이 또 우나, 또 울어. 손녀를 예뻐하는 마음과 그 손녀 때문에 고생하는 딸에 관한 안쓰러움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 나의 엄마, 순자에게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내 울음의 역사라면 익히 여러 번,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노라고 순자가 말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등에서 떼어놓기 무섭게 네가 울어대는 바람에 침대 위로 베개 탑을 쌓아 거기에 엎드려 잘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원래 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너 낳고서 애기를 안 좋아한다고.
한번 울년은 영원한 울년이어서 크는 내내 울었고 커서도 잘 울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참다 보니 이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울보였다. 그러니 나를 이룬 성장의 얼마쯤은 우는 힘으로 인해 가능했노라 말할 수밖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운 것인지 울어서 세포가 분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울수록 내가 되었다고, 자꾸만 더 내가 되었다고 말이다.
내게는 일명 ‘울음 치트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사랑하는 시인들의 시집들이다. 그들의 시는 내 눈물을 쏙 빼놓는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그렇다. 봐주는 법이 없다.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구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우는 내가 가끔은 나조차 웃길 지경이지만 어째서인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감히 말하자면 그건 아마도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서인데 설명할 자신은 없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할 뿐이다.
‘울다’와 ‘슬프다’가 동의어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땡볕>의 재생 버튼을 누른 지금 나는 슬프고 싶다. 울어서 슬프든 슬퍼서 울든 순서는 상관없이 다만 슬픈 상태에 잠시 놓이고 싶다. 이때만큼은 운다는 것과 슬프다가 동의어이다. 그러면 가사 한마디가 없는, 정말 땡볕 아래 서 있는 것만 같은 울렁거리는 멜로디로 가득한 이 노래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너무 따뜻한 나머지 눈물이 다 나는 걸까.
조용한 방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묻는다. 나의 슬프고 싶음을 이해하지요? 하루가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조금은 울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요?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그들의 시에서, 어지러운 이 노래에서, 나는 벌써 내가 바라던 대답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이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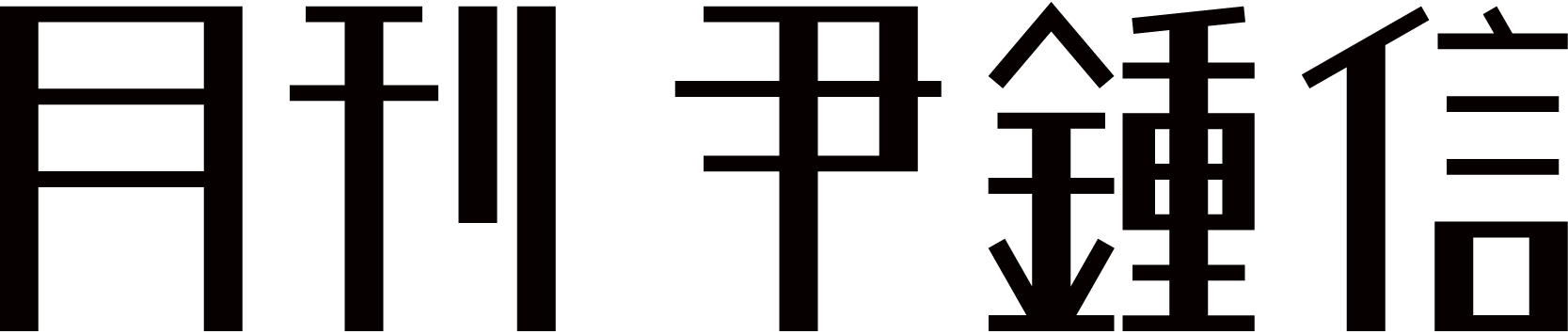
















2 comments
모야… 너무좋다 이슬글ㅠ 슬픔과 우는건 동의어가 아니야! 알아! 근데 나는 슬플때 운적이 있고 슬플때 울지 않은적이 있어 하지만 다른 어떠한 느낌에 운적은 없어! 그리고 나는 이슬 사랑해😘 근데 이 코멘트는 어디로 날라가는것이며 왜써야하는 거지요? 이슬 이거 보이나요??
조용한 방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고 결론에 도달아 홀가분해져버려 기분이 좋긴 하지만 조금은 울고 싶은 마음 . 그리고 어쩌면 줄줄 글을 쓰면서 내가 바라던 대답을 들어버린 오늘 아침 . “이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 이 상황에서 우연히 만나버린 이 글과 음악. 나 어떡해 또 찌잉.. .. 개복치다 진짜 ,,,. 오늘은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