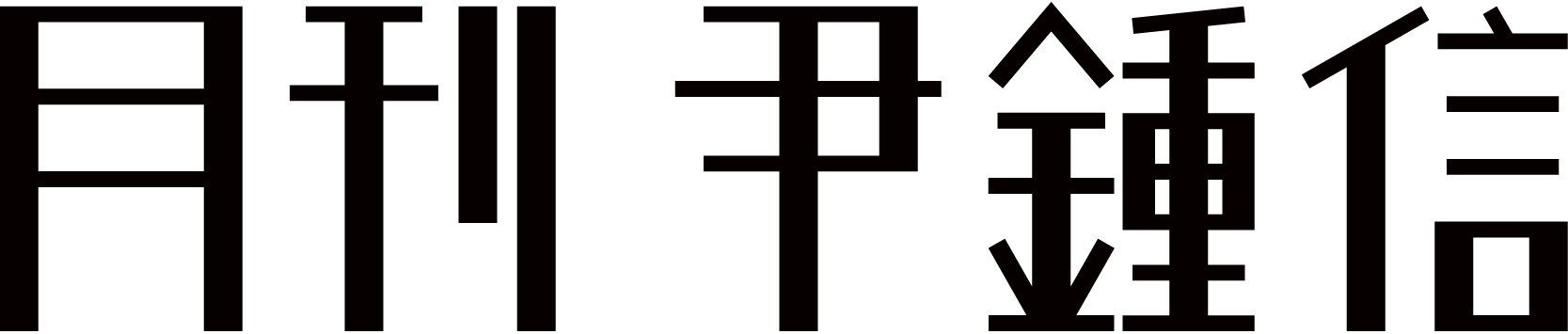최선을 다한 우울의 끝엔 뭐가 있나요

“행복한 사람…. 윤혜은 있잖아.”
책방으로 출근하자마자 동업자인 미화 작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근 그가 이웃책방인 ‘사적인서점’ 사장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뜻밖에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료의 대답에 사적인 사장님도 동의했단다. 맞아, 행복해 보이더라.
나는 조금 웃음이 났다. 꼭 1년 전 이맘때엔 동업자로부터 “요즘 혜은 씨, 안 행복해 보인다더라”라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극구 부정했지만 사실 들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빨개졌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 내 불행과 우울의 근원은 당시 오픈한지 한 달 남짓했던 이곳, ‘작업책방 씀’이었다. 아니다. 책방은 죄가 없지. 정확히 말하자면 책방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불확실성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다.
각오는 했지만, 매일 아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일 확진자 수를 안내 당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책을 팔고 남는 수익을 거듭 계산하면서
각오는 했지만, 손님맞이와 내 작업을 병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책방을 좋아하는 것과 책방지기로 보내는 일상과 친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직면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이 일상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을까 봐 무서워졌다. 이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뿌듯해 할 수도 없을까 봐 미리 전전긍긍했다. 크고 작은 긴장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노동에서 오는 뻐근한 보람 같은 게 적립되는 기분도 들었지만, 함박눈 쌓인 퇴근길 위에서 한낮의 일상은 진눈깨비처럼 쉬이 사라졌다. 걸음마다 마음이 푹푹 꺼지는 듯했다.
하루하루 성실하면서도 내일을 생각하면 아득해지는 내가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았다. 어떤 날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혹시 그게 리스너에게도 통하는 말인가 싶은 것이었다. 이어폰 너머로 안녕하신가영의 <우울한 날들에 최선을 다해줘>가 지독하게 반복 재생되는 겨울이었다.
‘나를 잘 알 것 같단 말은 하지 말아줘
그럴수록 난 더 알 수 없게끔 돼 버리니까
그런 말들에 괜찮은 듯 웃어넘기는 모습 뒤에는
슬퍼하는 날 만나지 않게’
돌이켜보면 처음 해보는 일에 따르는 시행착오였을 뿐인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의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동안엔 제 힘듦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다. 작은 투정도 스스로의 자질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양으로 어긋나버리기 일쑤니까. 욕심껏 일을 벌여 놓고서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한심히 여기게 되고, 그런 내 모습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애쓰느라 힘이 배로 든다. 물론 원하는 일을 하는 모두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게 내가 나의 책방과 친해진 과정인 걸 어쩌나.
‘우— 우울한 날들에 최선을 다해줘’
최선을 다해 우울해하다가 점차 우울한 날들에도 최선을 다해 책방을 돌보면서. 그러다 보니 우울에 아주 지지는 않는 사람이 되었다. 책방을 좋아하는 것만큼 마침내 이곳에 머무르는 나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책방에서의 내 모습 중 무엇이 가장 좋으냐고 묻는다면, 매일 누군가를 초대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는 나를 꼽고 싶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이 1인분 분량에 맞춰 굴러가고 있던 작고 좁은 세계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 하나가 생겨버린 것이다.
처음엔 그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내 것이지만 결코 내 것이기만 하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결국 세상을 환대하는 방법을 배웠다. 읽다 만 책처럼, 사람들이 머물렀다 떠나는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나와의 불화도 차츰 잦아들었다. 그들이 멀고도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싶어졌다. 물론 영영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서점에 누군가는 꼭 새로이 등장할 것을 아니까. 단절의 시대에서 신기하게도 자꾸만 연결되는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립이 새로운 덕목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내 삶은 신기하게도 확장되고 있음을 느낀다.
*
크리스마스 D-10. 위드 코로나로의 진입도 잠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며 출근을 준비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책방이 가까워질수록 이보 후퇴하는 기분도 어쩌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동업자와 익숙한 푸념을 나누는 사이, 문득 우리가 갑자기 매일 보는 사이가 되어도 서로를 여전히 좋아하며 존중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던 마음으로부터 참 멀리도 왔구나 싶었다. 망원동 골목을 휘감는 황망함은 여전히 매섭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제방도 제법 단단해 보여 다행이었다.
곧 혹독한 비수기를 맞이할 책방에서 우리는 모처럼 각자의 작업책상이 아닌 널찍한 손님 테이블을 차지했다. 동업자가 또 다른 이웃책방 ‘책방 사춘기’에 놀러 갔다가 사 온 크리스마스트리 키트를 늘어놓았다. 지지대에 나무를 세우고, 지점토를 빚어 엉성한 오브제를 달았다. 색종이를 오리고 붙여 서가와 현관에 가랜드도 걸었다. 손바닥에는 지점토가, 손가락에는 물풀 찌꺼기가 들러붙었다. 우리는 희끗하고 찐득거리는 손으로 박수를 치며 완성된 트리 앞에서 아이처럼 좋아했다.
사진을 찍고 자리로 돌아와 플레이리스트에 반가운 노래 하나를 추가했다. 최선을 다한 우울의 끝에서 오늘을 만났음을 잊지 않으려고. 언제고 우울에 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괜찮다. 그럴 땐 누군가의 평안을 바라는 듯한, 다정한 이름의 가수를 떠올리면 되니까. 안녕하신가영,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또 다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