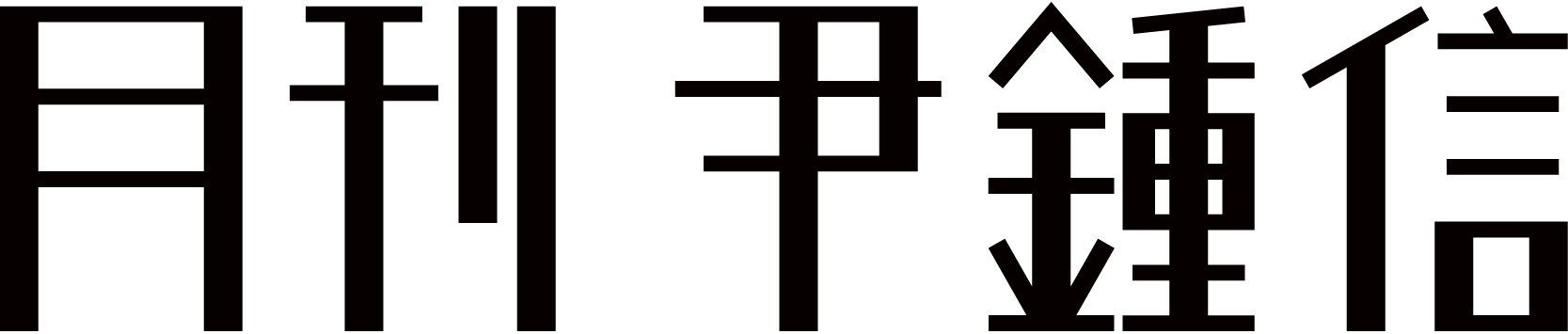그런다고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남매의 여름밤>은 콕 짚어 줄거리를 말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물론 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아빠(양홍주)의 사업이 망하자, 옥주(최정운)와 동주(박승준) 남매는 아빠와 함께 짐을 싸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김상동)의 오래 된 이층 양옥집으로 들어간다. 명분은 ‘여름 동안만이라도 아버지를 모시면 좋다’지만, 아빠가 재기를 노리는 동안 지낼 곳이 필요해 짜낸 궁여지책임을 모두가 안다.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지낸 고모(박현영)도 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로 어영부영 집에 눌러 앉는다. 가족들은 모기장을 치고, 오래된 선풍기를 돌리고, 수박과 콩국수와 비빔국수를 나눠 먹고, 때로 웃고 때로 싸우며 여름을 난다.
그러나 <남매의 여름밤>을 이런 줄거리로 수식하고 끝낸다면 그건 영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영화의 관심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식탁에 모여 같이 콩국수를 먹던 첫 날 밤, 면구스러운 마음에 움츠러들어 있던 아빠는 괜히 옥주에게 말한다. “넌 좀 편하게 먹어. 눈치 보지 말고.” 옥주는 답한다.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화처럼 보여도 밑에 흐르는 감정은 다르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무난히 적응해 주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과, 도망치듯 할아버지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상황이 민망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아빠가 내심 원망스러운 옥주의 마음이 교차한다.
표면 위로 드러난 말들과 수면 아래 감춰진 감정이 교차하는 이 섬세한 영화는, 그렇게 입밖으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자신들을 두고 떠난 엄마(이현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복잡하게 뒤섞인 옥주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는 동주, 오빠와 조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자라는 내내 모든 걸 오빠에게 양보해야 했던 서운함을 간직한 고모, 내색은 안 하지만 아이들에게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속상하고 상처가 된 아빠의 마음들이 한여름의 공기를 타고 화면 위를 떠다닌다. 그 속내들이 불쑥 터져 나오고 허물어졌다가 다시 아무는 과정이, 영화의 시야에 가득 고인다.

“아빠가 보는 걸 나는 못 보고, 난 보는데 아빠는 못 봐요. 둘 다 보려면 어떡하면 좋죠?” 에드워드 양의 유작 <하나 그리고 둘>(1999) 속 여덟 살 소년 양양(조나단 창)은 아빠 NJ(오념진)에게 묻는다. 양양은 막 방금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려고 빤히 들여다봤던 참이다. 옆집 사람들이 밤새 부부싸움을 하며 울던 것을 들은 양양은, 뒷통수만 봐선 왜 싸웠고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끝내 앞을 봐도 옆집 여자의 슬픔의 이유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양양은 생각한다. 모두 절반의 진실만 보고 사는 게 아닐까. 사람은 늘 앞만 볼 수 있지, 제 뒤통수를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못 보는 진실의 나머지 절반, “아빠는 보는 걸 나는 못 보고, 나는 보는데 아빠는 못 보”는 진실의 뒤통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 그리고 둘> 또한 <남매의 여름밤>이 그렇듯 뚜렷하게 하나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양양의 외삼촌 아디(진희성)의 결혼식으로 시작해 양양의 외할머니(당여운)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이 영화는, 양양의 가족들이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가 실패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뤘다. 양양의 엄마 민민(일레인 진)은 제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절에 들어가 답을 찾으려 헤매고, 그러는 사이 양양의 아빠 NJ는 첫사랑 셰리(가소운)를 우연히 다시 만나 흔들린다. 양양의 누나 팅팅(켈리 리)은 친구 릴리(에이드리언 린)과 그의 애인 패티(장육방) 사이에서 연서를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다가 패티를 향한 감정을 키운다. 지금의 삶이 공허하다는 마음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라났는데,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 속내를 주변과 나누지 못하고 제각기 혼자 방황한다.
밖으로는 그 감정의 격랑과 고립감을 말하지 못한 채 흔들리던 식구들을 바라보던 양양은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뒤통수를 찍는다. 물론 양양도 모른다. 아빠의 흔들림을, 엄마의 공허를, 누나의 첫사랑을. 뒤통수 사진을 찍는다고 각자 입밖으로 꺼내지 못한 자신만의 시간을, 각자가 느꼈을 생의 공허를 사진 속에 담아낼 순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양양은 묵묵히 사람들의 뒤통수를 찍는다. 그리고 양양의 가족들이 모두 저마다의 일탈에 실패한 채로 한 자리에 모인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양양은 말한다. 언젠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즐거울 것 같다고.
귀신도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말 안 하는 상대의 감정을 다 알아주고 서글픔을 모두 읽어내는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양양처럼 그러기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면 위로 주고 받는 대화 너머 기저에 흐르는 감정들을 조심스레 읽어가며 여름 한 철을 보냈던 <남매의 여름밤> 속 가족처럼, 진실의 양면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서로의 상처를 어림짐작으로 헤아리던 그들처럼. 그럴 수 있다면 우린 아주 조금은 덜 외로워질지 모른다. 양양의 말처럼, 정말 즐거워질지 모른다.
감독 에드워드 양
주연 오념진, 금연령, 켈리 리, 조나단 창
시놉시스
8살 소년 양양은 아빠 NJ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는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찍는 양양. 양양의 사진 속에는 사업이 위기에 빠진 시기에 3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아빠 NJ, 외할머니가 사고로 쓰러진 뒤 슬픔에 빠져 집을 떠나있게 된 엄마 민민, 외할머니의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누나 팅팅, 그리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진실의 절반’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