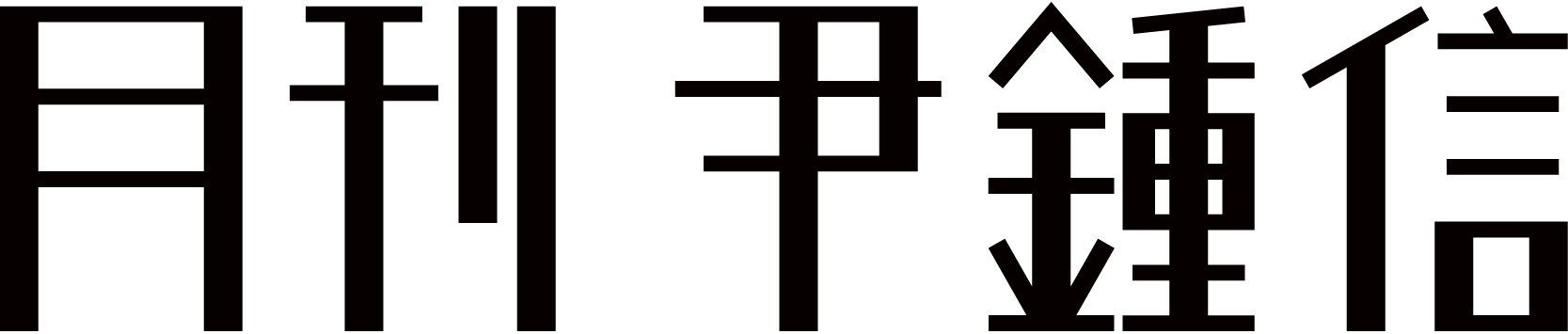허공에 흩어져버릴 이야기를 붙잡아 육신을 입히는 사람들

* <작은 아씨들>과 <로마>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글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의 원작 <작은 아씨들>에서 조가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한 계기는 엄마 마치 여사의 설득이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아무 것도 못하고 있던 조를 걱정하던 마치 여사는, 딸이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해했다는 걸 떠올리며 글을 써볼 것을 권유한다. 이미 몇 차례 신문기고와 출간을 경험하며 세상의 혹평과 편집자의 강도 높은 편집을 경험한 조는 자신의 글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하지만, 마치 여사는 말한다. 세상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위한 글을 써보라고.
그레타 거윅이 만든 2019년판 영화에선 전개가 조금 다르다. 투병 중인 베스(일라이자 스캔런)는 조(시얼샤 로넌)에게 언제나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한다. 조는 자신이 쓴 글 따위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고 답하지만, 베스는 “그렇다면 이번엔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련의 예정된 사건들이 지나간 직후, 조는 마치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는 장수처럼 돈벌이를 위해 신문에 기고하던 자극적인 가십 소설들을 벽난로에 태워버린다. 베스를 위해 쓰고 있던 이야기 하나만을 남겨둔 조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이야기를 다듬는다. 마치 여사(로라 던)는 그런 조를 위해 집필이 끝날 때까지 다락방으로 먹을 것을 올려주며 묵묵히 기다린다.
“누가 가정사의 고단함과 즐거움 같은 데 관심을 두겠어?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안 중요해 보이는 건 그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아니야. 글쓰기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 중요도를 반영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글로 쓰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지.”
요즘 쓰고 있는 글은 없냐는 에이미(플로렌스 퓨)의 말에 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글을 쓰고 있노라 말하지만, 에이미는 잘라 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안 중요해 보이는 건, 그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 계속 쓰라고. 언니가 쓰는 이야기는 모두가 좋아하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도를 잃고 허공에 날아가게 두지 말고 꼭 써서 그게 중요한 이야기란 걸 보여 달라고.
여성들의 서사는 종종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록에서 탈락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되곤 한다. 사회변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웅서사도 아니지 않냐고. 핵심 줄거리를 뽑아 내는 일조차 어려워 시놉시스를 적을 때면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정도로 축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과연 누가 좋아하겠냐는 질문 앞에서, 여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육신을 입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곤 한다.
에이미의 말이 맞다.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건, 남자들이 등장하는 선 굵은 이야기만이 의미 있다는 세간의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그 고정관념에 짓눌려 기록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말할 것이다. 거 봐,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었잖아. 하지만 일단 기록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경탄할 것이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2018) 속 은희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레타 거윅의 장편 연출 데뷔작인 <레이디버드>(2017) 속 레이디 버드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레타 거윅은 <작은 아씨들>의 줄거리만큼이나 루이자 메이 올콧이 자전적인 소설을 끝끝내 써내어 세상에 남겼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는 걸 간파하고는 그 과정을 영화의 핵심으로 삼았다. 영화의 영문 태그라인이 ‘Own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되라는 문장인 것만 봐도 그렇다. 대수롭지 않다고 치부되며 잊혀지고 말았을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붙잡아 끝끝내 육신을 입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만든 작품. 나는 <벌새>와 <레이디버드>와 박완서가 남기고 간 수많은 소설들을 떠올리다가,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2018)에서 방황을 멈췄다.

알폰소 쿠아론은 <그래비티>(2013)로 흥행과 평단의 지지를 모두 확보해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품인 <로마>를 만드는데 착수했다. 유년시절 자신을 돌봐 주었던 입주가정부 리보리아 ‘리보’ 로드리게즈에게 바치는 이 개인적인 작품은, 리보의 삶에서 1970년~1971년 사이의 1년 남짓한 기간을 떼어내어 세필화처럼 집요하게 재현해낸다. 클레오(얄리트사 아파리시오)는 주인집 가정의 이혼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경험하고, 친구의 소개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가졌다가 남자에게 버림받는다. 그리고 이 흔하고 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1970년대 초 멕시코 사회의 맨 얼굴이 태피스트리처럼 수 놓인다. 사랑과 선의로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중산층 백인 고용주 가정과 인디오 가정부 사이의 계급 격차는 엄혹하고, 알바레스 정권의 독재는 백주대낮의 학살을 서슴지 않는다. 흔한 입주가정부의 삶에 아무도 깊은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 인디오 입주가정부는 1970년대의 멕시코를 온몸으로 관통하고 목격한다.
영화의 말미, 클레오는 주인집 가족과 함께 해변으로 여행을 온다. 클레오도 개인적인 상처를 받은 이후고, 고용주인 소피아(마리나 데 타비라)와 그 가족 또한 고난을 겪은 직후다.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은 탓에 다 함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착한 해변, 클레오는 주인집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밀려 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는 수영도 못 하면서 주저없이 바다로 걸어 들어가 아이들을 구해온다. 화급히 달려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클레오를 끌어안은 소피아는 클레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 순간, 클레오는 주인집 가족도 관객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중의 진실을 토로한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온 그 묵직한 한 마디를 세상에 기록하기 위해, 알폰소 쿠아론은 오랜 기억을 더듬고 리보에게 확인을 받는 걸 거듭해가며 <로마>를 만들었다.
<로마>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되어라’는 명제에 딱 들어맞는 작품은 아니다. 이 작품은 리보가 아니라 리보가 고용된 중산층 백인 가정의 막내아들인 알폰소 쿠아론의 눈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시선과 인디오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는 작품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일단 기록으로 남았기에 가능한 비판이 아닌가. 기록이 없다면, 기록의 관점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다.
난 <로마>를 떠올릴 때마다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을지 모를 인디오 여성의 삶을 끝끝내 붙잡아 기어코 영화로 남긴 쿠아론을 생각한다. 커리어의 정점에 올라 원하는 작품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손에 넣었을 때, 할리우드를 매료할 스타 캐스팅도 없고 스릴 넘치는 스펙터클도 없는 한 인디오 여성의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주저없이 나선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한다. 다른 영화들은 자신이 아니어도 만들 사람이 있었겠지만, 리보의 이야기는 자신이 아니면 기록으로 남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절박함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통해 역사가 된 리보의 삶을 생각한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다. 그리고 오로지 사랑을 다 해 기록하는 것만이, 수많은 개별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한다.
감독 알폰소 쿠아론
주연 알리차 아파리시오, 마리나 데 타비라
시놉시스
멕시코시티 내 로마 지역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 가족의 젊은 가정부인 클레오(얄리차 아파리시오)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는 흘러간다. 감독 자신을 키워낸 여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작품은 1970년대 멕시코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가정 내 불화와 사회적인 억압을 생생히 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