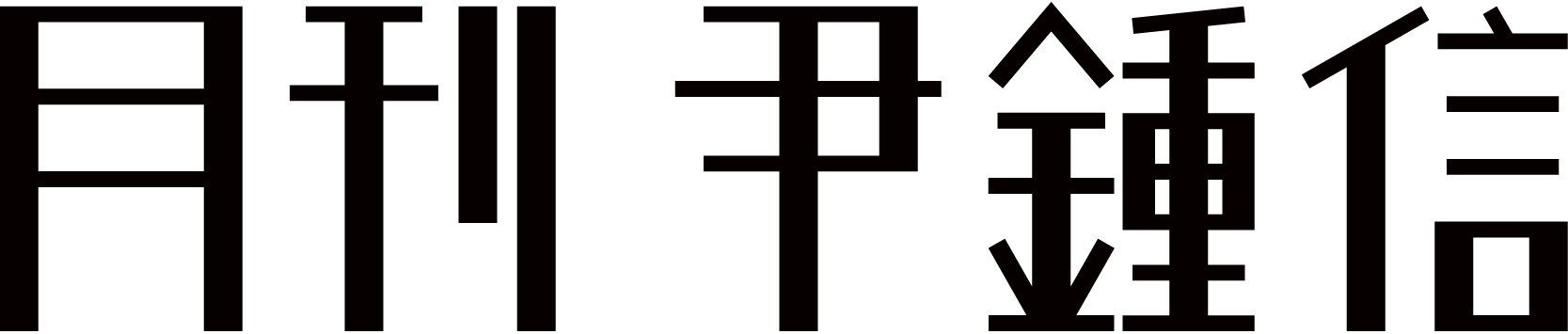친구

나는 아직도 그애를 기억한다. 내가 그애를 만났을 때 나는 아르바이트며, 몸을 쓰는 일이라면 전부 하려고 했었다. 돈을 벌고 싶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았다.
그애는 학생이었고 나는 학생은 아니었다. 학생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길거리를 쏘다니는 게 지겨웠던 것 같다. 물론 나는 제대로 그래본 적도 없었다. 그저 단지 어설프게 누군가의 틈에 그림자처럼 끼여 있을 뿐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들 사이에 내 흐릿한 목소리가 끼여 있는 게 싫었다. 오히려 혼자서 뚝방을 걷거나 태풍이 오기 전 조용하고 맑은 하늘을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었다. 혼자 있으면 벙어리처럼 있어도 되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가끔 그애가 어디선가 나타나 말을 걸어주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니까, 그애를 처음 만난 건 한남동 어느 반지하방 앞이었다. 막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애는 나와 골목 하나를 두고 반대편 건물 1층에 살고 있었다. 나의 집에 비하면 좋은 집이었지만 그애는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그득해지는 집이라고, 나중에 나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물론 지금 그 집은 너무 낡아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쌓아 올려진 지 오래였다. 3층짜리 치킨집이 들어왔다나 뭐라나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잘 알 수는 없었다. 그 집이 아니어도 어차피 그 지역이 다 그런 식이었다. 다만 그 집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애의 말을 떠올렸다. 맨날 비 올 것 같으면 곰팡이들이 벌써 버글버글해져. 나는 포클레인 사이로 삐져나오는 검댕이 같은 곰팡이들을 떠올렸다. 팔다리가 있는 곰팡이들, 누군가의 새끼처럼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곰팡이들을.
일을 끝마치고 들어가는 길ㅡ물론 그때가 새벽인지 아주 오밤중이었는지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ㅡ어느 날, 처음 보는 그애가 나를 보며 서 있었다. 덜 마른 머리칼에서는 복숭아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애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시선이 끌리지 않는 외모에 누구보다 평범한 인간이어서, 누군가 당연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그애는 우리집과 그애의 집 사이에 놓인 골목길에 서서 나를 아주 오래전 알았던 사람처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넌 맨날 뭘 그렇게 해? 어딜 그렇게 나가?
그애가 나를 뚫어지게 보다가 건넨 첫말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애의 표정 그애의 향기 그리고 그애의 덜 마른 머리칼이 붙어 있던 목덜미까지 자세하게 떠오르곤 한다. 나는 잠깐 이상한 전율에 새끼 강아지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는 이는 별로 없었다.
그애가 말하길 여기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나를 종종 보았고, 내가 돌아다니는 시간은 늘 불규칙적이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다고 말했다. 남들이 학교에 가거나 잘 시간에 나는 항상 무언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이 동네는 처음이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방학이라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텔레비전에는 매번 똑같은 프로만 틀어대서, 차라리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넌 맨날 뭘 그렇게 해? 어딜 그렇게 나가? 나를 보며 말을 건넨 그애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환하게 웃는 그애를 비껴 바로 집으로 들어왔다. 난 아무거나 해. 나는 아무거나. 차라리 그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골목길에서 몇 번 만나고 몇 마디 나누는 사이였다. 그애는 늘 웃는 쪽이었고, 나는 그 웃음을 비껴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쪽이었다. 그애를 만나고 들어가는 길이면 나는 항상 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 기분이 너무 어색해서 나는 집에 들어가서도 골목길에 그애가 여전히 서 있나 몰래 깨금발을 들고 창문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그애는 골목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애는 골목에 서서 습관처럼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귀가 가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귀를 가끔씩 감싸듯이 혹은 귓불을 살짝 잡아당기듯이 자주 귀를 만졌다. 나는 그애에게 왜 그런 것을 하냐고 묻지는 않았다. 나는 그애에게 질문이 별로 없었다.
나 이사 간다.
그래, 잘 가.
방학이 두 번 정도 끝났을 때 그애는 어딘가로 갔다. 나는 그사이, 하루에도 아르바이트 세 파트를 해치웠고 집에 가면 늘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애와 좀더 이야기를 해볼걸. 좀더 친구가 되어보려고 노력할걸. 나는 누워서 생각했다. 나는 그애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애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정말 짧게 만나고 빨리 헤어졌다. 그리고 그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가늠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한남동 언저리에 산다. 어떤 때 나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그때와 다른 점이 있긴 있다. 지금은 그때의 그 반지하방보다 조금 높은 곳에 살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으며,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가끔 기분이 울적하면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기도 한다. 시간은 어쨌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 아주 작은 단위를 바꿔주기도 하는 것 같다.
나는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애를 떠올린다. 정확히 왜인지는 모른다. 나는 매일 같이 거리에서 혹은 공원에서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어느 빵집 앞에서도 그애를 떠올린다. 그리고 매일 그애에 대해 쓴다. 많이는 아니고 하루에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씩, 그애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천천히 글자를 적곤 한다. 이 말들은 길거리에 붙은 벽보처럼 쓸모가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뭉쳐서 바닥에 던져버린다면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는 습한 날이면 벽에 달라붙어 커다란 곰팡이가 될 것이다. 팔다리가 달린 곰팡이들, 누군가의 새끼처럼 몸을 둥그렇게 말고 있는 곰팡이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애를 이런 식으로 계속 떠올리는 것이 좋다. 그애의 일상을 상상할 때 어딘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곤 하니까. 귓바퀴를 만지는 그애. 귓불을 잡아당기는 그애. 환하게 웃는 그애.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그애를 기억할 것이다. 한남동 언저리에서 다시금 방학처럼 찾아오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