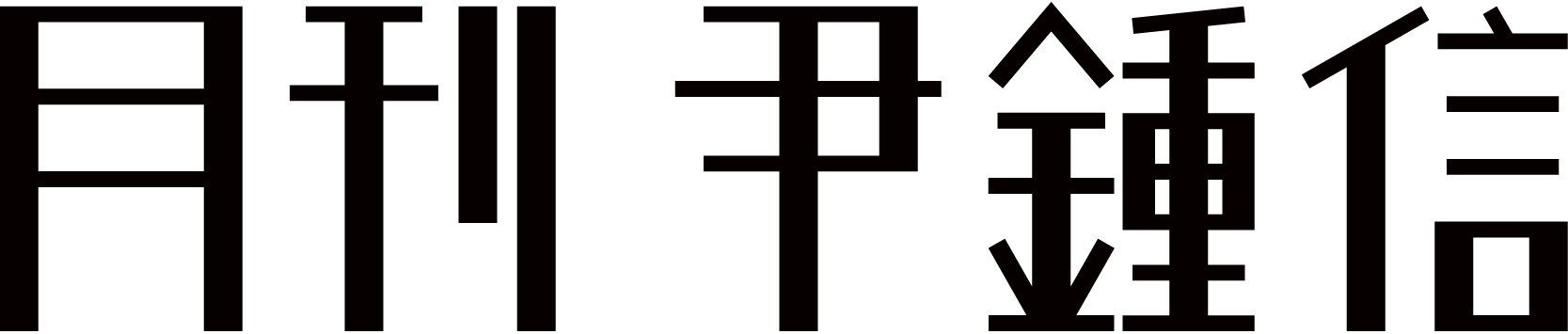세번째 이별

텐이 돌아왔다. 이른 아침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텐이 들어왔을 때 나는 시계를 봤다. 아침 일곱시가 조금 넘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텐이 돌아오다니.
텐은 지난여름에 떠났다.
잠깐 빵을 사러 다녀온다고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텐은 그날 오후 두시쯤 집에서 나갔다. 나는 저녁까지 텐을 기다렸다. 저녁 일곱시까지도 밖은 환했다. 그날 저녁에 문득 매미가 요란하게 울었다. 사이렌처럼 요란한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였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현관에 서 있는 텐을 보니 그날 그 순간에서 시간이 조금도 흐르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을 급속 냉동 시켰다가 꺼낸 듯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텐을 껴안았다. 텐은 모직 코트를 입었다. 코트에 찬 기운이 돌았다. 텐은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같았다.
“텐, 빵을 사러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네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아서 난 내 정체성을 잃을 뻔했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뻔했다고.”
“네가 누구인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 넌 무척 너 같아. 얼굴이 너무 부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지만 말이야.”
텐은 그런 말을 하며 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이런 이른 시간에 어디서 빵을 샀을까. 떠오르는 곳이 없었다. 빵은 특색 없는 갈색 봉투에 들어 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었다. 빵은 굳고 말랐다. 나는 빵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어제 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설마 이틀 이상 지난 빵은 아니겠지? 나는 목이 메어서 일어났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 보리차를 끓였다.
뜨거운 보리차를 텐에게도 한 잔 줬다.
텐은 고양이 혀다. 뜨거운 것을 잘 마시지 못한다. 그런데도 성격이 급해서 일단은 입에 대고 본다. 나는 컵을 입에 살짝 댔다가 뜨거워하기를 반복하는 텐의 멍청한 모습을 봤다. 텐을 보고 있으면 즐거워진다.
“이 동네는 여전하네. 집도 하나도 안 변했고.”
“겨우 세 달인데 뭘. 그사이에 변해봐야 뭐가 얼마나 변했겠어.”
“요즘은 뭐든 금방 바뀌어버리잖아. 길도, 사람도. 뭐든.”
“글쎄, 그런가?”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잖아. 생각 안 나?”
생각 안 날 리가. 텐과 했던 것이라면 뭐든 기억하고 있다. 해밀턴 호텔 앞을 지나가며 그곳의 수영장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던 일이나, 겨울밤에 손을 잡고 나가서 피비플러스에서 피자와 치즈버거를 먹으며 책을 읽었던 시간과 이 동네의 높고 낮은 언덕길을 걷고 또 걸었던 그 수많은 산책들을 나는 모두 선명히 기억한다.
텐과 함께 걸을 때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텐의 목소리가 음악 소리보다 듣기 좋았으니까.
텐과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텐이 떠난 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텐과 자주 가던 헬카페나 챔프커피, 주말에만 여는 카페와 서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을 자주 느꼈다.
어느 날은 다른 동네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멍해진 적이 있다. 9월 말, 토요일 저녁이었다. 이태원역의 에스컬레이터는 언제 봐도 너무 길다. 그 길고 긴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줄은 끊임없이 길어지기만 했다. 나는 문득 막막해져서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못하고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들은 여자거나 남자였고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내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행복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춤, 웃음, 음악, 섹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 게 어디 있을까.
그곳에 서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음침한 일이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에야.
그날 저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텐이 이 동네에서 건물 하나를 두고 벌어진 분쟁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나는 텐의 말을 막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피곤해.”
“논, 너 그새 조금 변했구나.”
“변했지. 네가 오래 떠나 있었잖아.”
“겨우 세 달.”
“혼자 있는 세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불쑥 화가 치밀어올랐다. 나는 텐을 노려보고 싶지 않아서 먼 곳을 응시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혼자인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거짓말. 네 성격에 퍽이나 혼자 지냈겠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겠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미쳐가는 동안 말이야. 난 괴팍해졌어. 완전히 괴팍해졌다고.”
“넌 원래 그랬어. 이제야 너 같다. 내 친구 논이 맞네.”
“친구라는 말 쓰지 마. 거슬려.”
“그럼 뭐라고 할까?”
“뭐든 얘기하지 마. 지금 널 죽이고 싶은 기분이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이 돌았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텐의 얼굴은 흰 종이 같다. 나는 그 얼굴을 좋아한다.
텐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웃었다.
“찬물 좀 줄래? 차가 식지를 않네. 너무 뜨거워.”
나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다. 물병을 꺼내 돌아섰을 때 텐이 앉아 있던 의자는 비어 있었다. 그 순간 텐이 전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다. 지난번에 왔을 때 텐은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갔다. 그때 텐이 사온 빵은 마르지 않은 빵이었다. 그날 구운 빵. 나는 그 빵을 먹지 않고 냉동고에 넣어놓았다. 가끔 냉동고를 열어 그것을 본다. 그것은 갈색 봉투에 들어있다. 텐이 가져온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