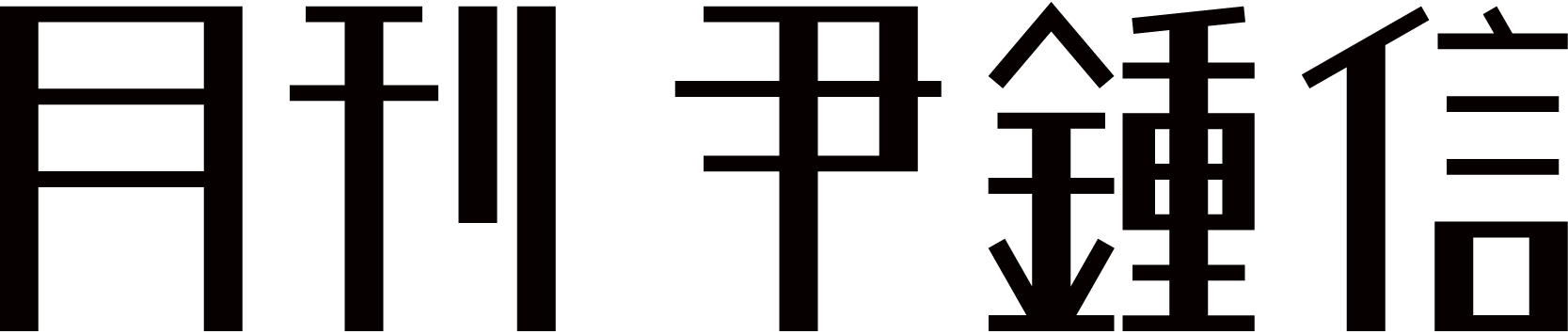수많은 얼굴들의 세계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바꿔주는 어플이 유행했다. 그 어플이 얼굴을 바꿔주는 대상은, 인간에 한정되지 않다. 강아지나 석고상처럼, 사람이 아닌 것과도 얼굴을 바꿔준다. 다소 우스꽝스럽고 ‘낯선’ 느낌 때문에, 유머 게시판에서 그에 대한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내가 에바 알머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엄마는 해녀입니다』(난다, 2017)를 통해서였다. 제주 해녀 사진에 감흥을 받은 에바 알머슨은 직접 제주를 찾아 그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 이후,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던 고희영 감독이 에바 알머슨의 그림을 보게 된다. 그렇게 제주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해녀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담아낸다.
『엄마는 해녀입니다』는 외국의 작가가 그린 해녀의 이야기지만, 전혀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인상 깊었었다.
또 하나, 내가 에바 알머슨에 주목한 까닭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때문이었다.
—
몇몇 중세 유럽 황실 가족을 그린 그림을 살펴보면, 아이와 어른의 얼굴에 차이가 없다. 어른의 얼굴을 한 아이들은 다만 키나 몸만 작게 표현된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 속 인물들의 얼굴도 아주 비슷하다. 어른도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옷이나 머리 모양이 다르더라도 어딘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 얼굴들은, 황실 가족의 초상과 달리, 어른이 아닌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
에바 알머슨의 전시는 평일임에도 사람이 많았다. 단체로 온 아이들이 도슨트와 함께 전시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을 피해가며 에바 알머슨의 그림을 보았다.
실제로 에바 알머슨의 그림을 감상하고 특이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는데, 아이같은 얼굴의 사람들과 함께 그려진 동물의 얼굴은, 사람과 반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
이 전시의 부제는 ‘행복을 그리는 작가’였다. 그런데 행복이란 얼마나 추상적 개념인가.
전시 내내 에바 알머슨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예술 철학에 대해 설명해준다. 정신적 충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어두운 면을 표출한다. 혹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향해 열어놓는다. 하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 어떤 공감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전시 속의 작품 해설은 내게 사족에 가까웠다.
아이와 어른의 얼굴이 닮아 있는 이 작품들만으로도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에서, 인간보다 어른스러운 동물의 표정을 보며 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린 어떤 동물로 살아가고 있나.
—
얼굴을 바꿔주는 어플을 나도 딱 한 번 사용해본 적이 있다. 남자친구와 내 얼굴을 바꿔보니 그것은 정말 못 봐줄 것이 되었는데, 그 낯선 얼굴을 보며 웃고 웃었다.
도슨트와 함께 진지한 어린이 관객들, 반대로 에바 알머슨의 그림을 보며 ‘저 여자는 머리카락 가지고 참 장난을 잘 쳐’라고 소곤거리던 중년의 관객. 어른다움이, 아이다움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에바 알머슨이 그리는 행복에는 어떤 천진난만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
어린이의 얼굴로 바뀌는 어른의 나를 상상해본다. 이번 에바 알머슨의 전시가 일종의 ‘어플’ 역할을 해준 셈이다. 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얼굴을 바꿔주는 어플과 같이, 내 친근한 동물과 얼굴을 교환해보고, 유적지에서 발견된 오래된 두상, 만화 캐릭터 등이 되어보는 다양한 경험 속에 놓인다. 그리고 그 낯선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든 불편함을 느끼든, 그 모든 감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진지하든, 경박하든, 아니면 즐겁거나 경건하든, 모든 행복은 주관적이며 각각의 것으로 가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