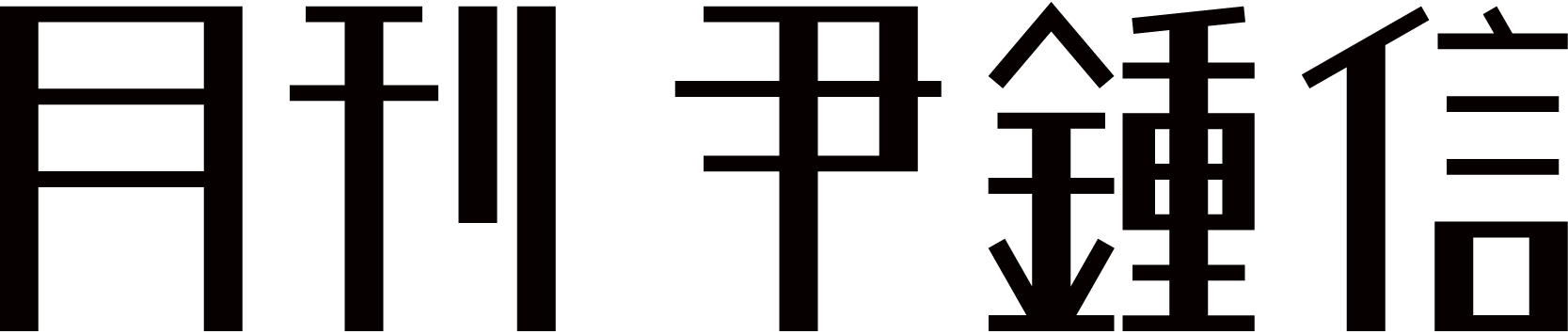달 산책
 용주는 동미에게 러닝머신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동미는 이사할 집에 그걸 놓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했다. 몇 달 전 옆집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버릴 건데 혹시 쓰겠냐고 물었을 때 신나서 받은 사람은 동미였다. 그때도 용주는 집도 비좁은데 쓸데없는 걸 받아왔다고 투덜거렸다. 러닝머신은 금세 옷걸이가 되었는데 대체로 용주의 옷이 걸려 있었다.
용주는 동미에게 러닝머신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동미는 이사할 집에 그걸 놓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했다. 몇 달 전 옆집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버릴 건데 혹시 쓰겠냐고 물었을 때 신나서 받은 사람은 동미였다. 그때도 용주는 집도 비좁은데 쓸데없는 걸 받아왔다고 투덜거렸다. 러닝머신은 금세 옷걸이가 되었는데 대체로 용주의 옷이 걸려 있었다.
“안 가져갈 거면 버려. 난 필요 없으니까.”
“니가 버려.”
“왜 내가 버려?”
“니 거잖아.”
“왜 내 거야? 니가 가져왔잖아.”
“그동안 니가 썼잖아. 여기, 여기, 걸려 있는 옷들, 이거 다 누구 건데?”
용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달리 반박하지 않았고 동미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동미는 짐을 싸고 있었다. 둘은 일 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헤어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라 어차피 한 사람이 들고 내려가기엔 좀 버거웠으므로 둘은 3층에서 1층까지 함께 러닝머신을 들고 날랐다. 그것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5층에 사는 주인이 찾아와서 혹시 러닝머신을 버렸냐며, 그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서로 만원을 내기 싫어서 또 싸웠다. 한참 싸운 끝에 둘은 동네 뒷산에 러닝머신을 버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지난봄에 손잡고 산책 삼아 오른 적이 있는 산이었는데 중간에 덤불이 우거진 진창이 하나 있었다. 무단투기 명소인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깨진 화분이며 의자, 어떨 땐 소파도 있었다. 누가 양심도 없이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둘은 손을 잡고 욕을 했었다.
“뭘 그렇게 껴입어, 어디 에베레스트 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설 채비를 할 때 패딩에 털모자까지 뒤집어 쓴 용주를 보고 동미가 한소리 했다.
“밖에 엄청 추워. 안 입으면 후회할걸.”
그건 틀린 말은 아니어서 동미도 잔뜩 껴입었고 현관을 나서기 전에는 용주가 찾아놓은 목장갑을 나눠 꼈다.
러닝머신은 바퀴가 있어 산 초입까지는 굴려서 왔다. 어둠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드륵 드르륵 굴러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산길에서부터는 접어서 앞쪽에서 용주가 들고 동미가 뒤따랐다. 아무래도 동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얼마 가지 않고 자리를 바꿨다. 어느 쪽이건 무겁긴 마찬가지였다. 어두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러닝머신은 무거워졌다. 바람이 찬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반쯤 갔을 때 둘 다 속으로 후회를 했다. 어쩌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과정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쨌든 상대를 열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다. 구름도 없는 까만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이렇게 달 밝은 밤에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하다니.
“여기다 버리자.”
진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동미는 지쳤기 때문에 얼른 러닝머신을 버리고 내려가고 싶었다.
“여긴 너무 산책로 옆이잖아. 저 구석에 버리자.”
용주는 러닝머신을 들고 무성히 자란 풀들을 짓밟으며 앞장섰다. 동미는 엉거주춤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버릴 장소를 고르고 러닝머신을 내려놓았을 때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손을 탈탈 털고 잠깐 서서 숨을 고를 때 용주가 물었다.
“너 이거 사고 한 번도 한 적 없지?”
“산 거 아니야.”
“그래, 옆집에서 얻어서, 없지?”
동미는 대답 대신 러닝머신을 펼쳐서 그 위를 걸었다.
“뭐하는 거야.”
용주가 웃었다. 조용한 산속이라 소리는 크게 울렸다. 어두워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미는 그 표정을 잘 알았다. 용주도 러닝머신 위를 잠깐 걸었다.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걸었다.
“문워크 같네.”
“문워크야. 너도 해봐.”
“안 돼. 나는 몸치잖아.”
“안 어려워. 자, 봐봐. 왼발이 이렇게 한 걸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왼발을 뒤로 미는 거야.”
동미는 그걸 따라해 보다가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싶어서 웃었다가 끝내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이건 내가 네게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될까. 정확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속에서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용주는 러닝머신 위를 계속 걸으면서 오른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다.
“저거 남산타원가?”
높게 솟은 아파트들 너머로 간신히 보이는 탑이 있었다. 붉은 조명을 깜박이는 그 끄트머리가 남산타워와 비슷해 보였지만 하늘은 캄캄하고 전체가 다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방향에 남산타워가 있는 게 맞는지도 헷갈렸다.
“동미야,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옛날에 여기 이사 왔던 날에 짐 풀다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너도 나도 대박 나면 부자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한남동 같은 데로. 그럼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산식물원에 산책도 자주 가자고. 너 그런 데 좋아하니까.”
동미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밀가루풀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빈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중국집에서 세트메뉴 1번을 시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다가 우리 지금은 배달음식과 세트메뉴를 전전하지만 나중에는 근사한 데 가서 온갖 요리를 먹자…… 했던 것이 고작 일 년 전이었다. 그때는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게 제일 간단했다. 지금은 그저 코웃음만 쳤다.
“넌 참 비위도 좋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용주는 “하하, 그렇지.” 웃으며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왔다.
“그만 내려가자.”
마지막으로 둘은 진창 위로 러닝머신을 쓰러뜨리고는 휴대폰으로 앞을 밝히며 산을 내려왔다. 앞장서 터덜터덜 내려가는 용주를 뒤따르면서 어째선지 동미는 눈물이 날 뻔했는데 아아, 이제 용주 때문에 울지는 않을 거야, 하고 참았다. 더군다나 뒤에서는. 울 거면 앞에서 울어야지.
산에서 빠져나오자 모든 빛이 눈부셨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초입의 술집에는 알전구로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가 서 있었다. 동미는 작년에 딱 한 번 쓴 트리를 자신이 가져야 할지 용주에게 줘야 할지 잠깐 생각했다. 술집 앞을 지날 때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가 작게 흘러나왔다. 동미는 그 노래를 몰랐지만 괜히 따라 흥얼거리며 입에서 뿜어져나오는 희뿌연 입김을 보면서 참 덥다고 생각했다. 용주도 노래를 부르는지 입김이 뻐끔뻐끔 새나왔다. 그러다 살짝 눈가를 닦는 것 같았는데 동미는 어쩌면 용주가 울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원래 좀 울보니까. 그냥 찬바람을 많이 쐬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동미는 남은 짐을 쌀 것이고 이틀 뒤엔 새집으로 이사를 간다. 둘이 함께 외출했다가 함께 돌아오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함께 한남동으로 이사 가거나 남산식물원을 산책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남산타워였는지 뭐였는지 모를 탑은 건물들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해서는 땀도 다 식어서 이제 동미는 참 춥다고 생각했다. 이 추운 겨울을 또 어떻게 나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봤자 곧 봄이 오긴 할 것이다.
시간은 참 빨리 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