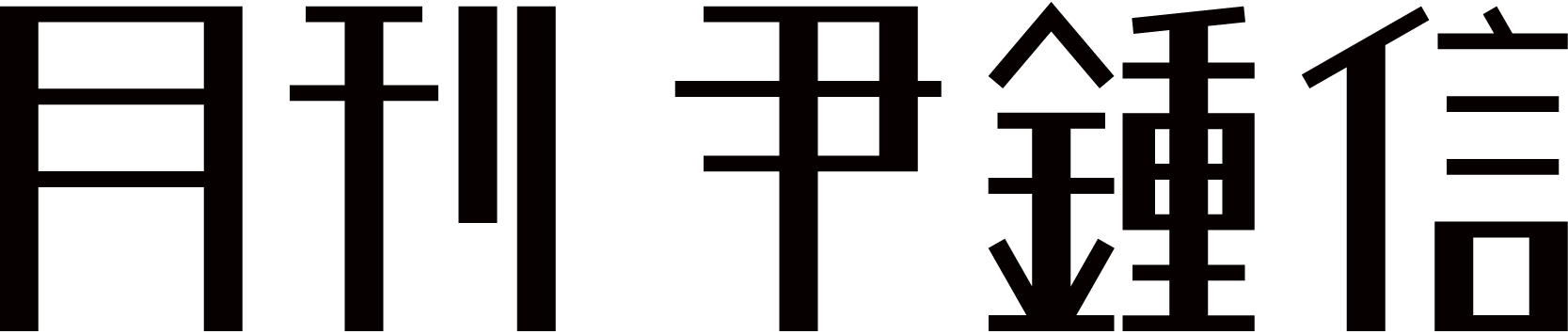그레이프 브릭

그해 여름 진우는 그레이프 브릭에서 연주했다. 일을 나가는 주말 저녁이면 좀 시무룩해져선 한참이나 소파에 웅크려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줄담배를 피워 좁은 방을 너구리굴로 만들었다. 나는 진우의 침대에 널브러진 채 그가 하는 양을 곁눈질로 쫓았다. 출근을 한 시간 앞두고서야 진우는 가벼운 샤워를 하고 나와 비비 크림을 발랐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행어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검은 재킷을 찾아 들었다. 그것은 진우가 가진 유일한 여름 재킷으로, 봄에서 초가을까지 진우는 모든 공연에서 그 옷을 입었다. 늘어진 티셔츠 위에도, 칼라가 있는 흰 셔츠 위에도. 친구들의 졸업 연주회에 갈 때나 누군가의 결혼식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주 단순한 원 버튼 재킷이었고, 그래서 딱히 미울 구석도 없는 옷이었는데 나는 어쩐지 지겨운 마음에 그걸 입은 진우의 뒷모습을 노려보곤 했다.
진우의 집을 나와 낡은 단층 주택이 모인 언덕을 내려오면 곧 골목 쪽으로 창을 활짝 열어젖힌 몇 개의 카페와 루프탑 레스토랑, 버거펍이 나왔다. 함께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섰을 때면 진우는 곧잘
그냥 집에 있지 그래
하고 말했다. 길어야 네 시간이면 일은 끝날 테지만, 나는 가끔 진우의 낮고 컴컴한 집에 남겨지는 대신 그를 따라 버스에 오르는 편을 택했다.
해방촌에서 한남동까지는 십오 분쯤 걸렸다. 몇 년 전까지 대학 캠퍼스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동네 어귀에서 우리는 내렸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건물이 단정하게 늘어선 길목을 한참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가게라곤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면 그 길 끝에 그레이프 브릭이 있었다. 그레이프 브릭은 겉보기엔 오래된 엔틱숍 같았다. 작은 할로겐램프 두 개가 붉은 간판을 비췄고, 그 아래론 오래된 자명종 시계와 보석 따위가 놓인 쇼윈도였다. 하지만 가게의 진짜 출입구는 건물 뒤편에 따로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큼지막한 도어노커가 달린 비밀의 문이 보였다.
몇몇 블로그와 기사에 따르면 그레이프 브릭은 한남동에 속속 생겨난 스피크이지 바 중 하나였다. 스피크이지는 금주법 시대 상류층을 대상으로 밀주를 팔던 비밀 술집이라고 했다. 빨간 전화부스 안쪽으로 가게가 펼쳐진다거나, 책장을 뒤로 밀면 문이 열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게마다 출입구를 숨기는 방식도 다양했다. 알 만한 사람들만 찾아오면 된다는 듯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그레이프 브릭은 개중에선 비밀스러운 재미가 좀 떨어지는 곳이었지만, 한국에 유통되지 않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직수입해 서비스하고, 20년대 미국의 풍경을 충실히 연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20년대 미국이 어땠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레이프 브릭에 끌렸다. 거기선 묵직한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된 목재를 수입해 꾸몄다는 한쪽 벽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었다.
조도가 낮은 가게에 들어서면 진우는 따로 누구와 인사를 나누지 않고 곧장 피아노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바텐더 중 한 사람이 와서 피아노 위에 물과 위스키를 놓아주었다. 가끔은 내게도 트러플 오일이 든 마티니 같은 것을 만들어주었다.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대로, 나는 가장 싼 위스키를 한 잔 주문해 마시면서 진우의 연주를 들었다. 진우는 듣기 편한 재즈나 블루스를 쳤다.
진우를 그곳에 소개한 이는 진우의 대학 선배였다. 그 무렵 진우가 꾸리던 크로스오버 밴드 멤버들이 동반 입대를 했고, 진우가 가르치던 레슨생은 한국에서의 대입을 포기하고 유학을 떠났다. 그의 아버지는 퇴직금을 남해의 골프장 사업에 밀어넣었다가 날리고는, 어디선가 술을 진탕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연금을 미리 당겨 뽑은 새 외제 차를 박살 내기도 했다. 여러모로 시간이 많고, 돈은 없으며, 조금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 시간에 오만 원. 두 시간에서 네 시간 동안 내키는 대로 연주할 것. 팁은 연주자의 몫. 생각하기에 따라서 적기도, 많기도 한 금액이었다. 진우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결국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려와는 달리 그레이프 브릭에서 진우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진우의 선배가 누보리치 치곤 꽤 말이 통한다고 소개했던 사장은 한 번도 바에 나타나지 않았다. 진우가 연주를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면 매니저가 와서 빳빳한 오만원 권이 든 봉투를 내어주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걸었다. 널찍한 도로를 따라 곧 이태원역이, 또 녹사평역이 나왔다. 때마다 서로 다른 도시인 듯 풍경이 휙휙 바뀌었다. 나와 진우는 별 얘기 없이 담배를 나눠 피우고 편의점이 눈에 띄면 들어가 맥주를 사 마셨다.
마지막으로 그레이프 브릭에 간 것은 진우가 일을 그만두고 몇 주가 지난 때였다. 진우의 선배는 언제든 한번 와서 술을 마시고 가라는 사장의 말을 전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곳을 잊고 지냈다. 그날엔 어쩐 일인지 술이 몹시 마시고 싶었는데 각자 통장에는 십만원쯤밖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 진우와 나는 처음으로 그레이프 브릭의 깊은 소파에 함께 몸을 묻었다. 그리고 바텐더가 추천해주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차례로 마셨다. 꽤나 오랫동안 위스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진우가 연주하던 피아노에는 나이 지긋한 백인 남성이 앉아있었다. 남자는 재즈를 쳤고, 진우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다른 손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긴 박수를 보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진우에게 목례했다. 그 남자는 그레이프 브릭의 마지막 인테리어처럼 가게에 꼭 어울렸다.
진우와는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뜸해졌다. 그 후론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갈 일도 별로 없었다. 그레이프 브릭에 대해 다시 검색해 본 것은 얼마 전 일로, 그 근처의 미술관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때였다. 그레이프 브릭은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억을 떠올릴만한 사진은 찾아낼 수 없었다. 나는 구글 창에 그레이프 브릭을 영어로 적어 넣어보았다. 그것은 말 그대로 포도를 건조해 네모나게 찍어낸 블록이었다. 금주법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온에 숙성시켜 몰래 와인을 만들어 마셨다고 했다. 나는 검붉고 표면이 거친 포도 벽돌 사진을 잠깐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그레이프 브릭의 무거운 먼지 냄새와 자주 푸석하고 표정 없던 진우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다. 마침 저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