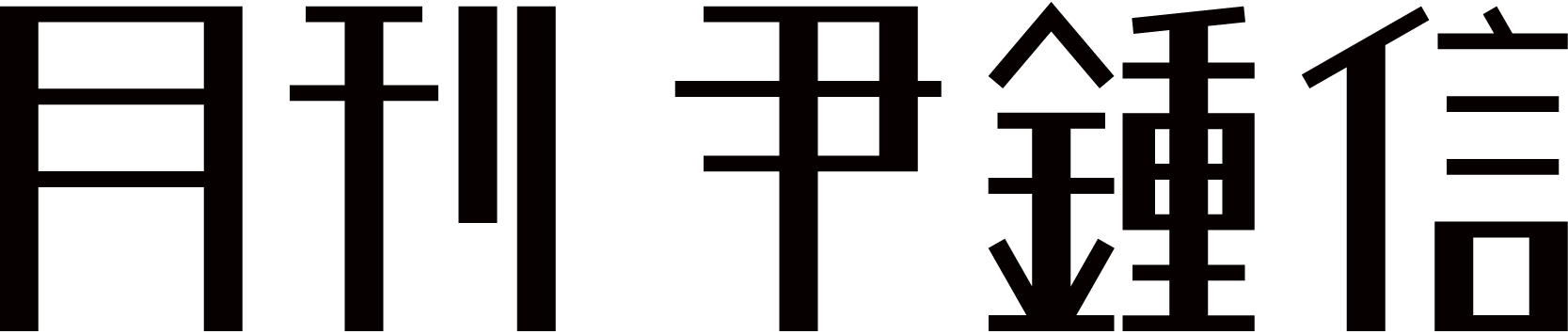*reprise

지난여름, 나는 만 서른 살이 되었고, 조금은 비혼주의자가 되었으며, 전에 없이 오픈 릴레이션십에 호의적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으며 성적 긴장감은 망상이 아니라면 없다. 나는 내 인생이 재미없는 편을 기꺼이 택할 것이며 굳이 따지자면 그건 좋은 느낌에 훨씬 가깝다. 나는 한남동에서 마지막으로 재미있었다.
(우리집에서) 한남동을 가는 세 가지 방법
1. 경의-중앙선을 탄다. (지상철 구간의 풍경이 아름답다.)
2. 740번을 타고 녹사평에서 내려 조금 걷는다. (삼각지 고가에서의 풍경이 아름답다.)
3. 6호선 한강진역에서 내린다. (X)
애니웨이, 용산의 맥락을 따라 한남동을 가는 편이 좋다.
경의-중앙선 지상철 구간의 근사함. 지상철 구간은 고가 위는 대개 근사하다. 그저 철도 위를 달릴 뿐인데 잠시 내려다보이는 고가일 뿐인데 들뜬다. 놀이기구의 흥분은 아니야, 레트로 퓨처 그림이 선사하는 현기증에 가깝고 황홀하고 맥빠진다. 고작 이거다, 애걔 이 정도? 이것은 지났고 저것은 못 됐고 그건 터무니없었던 조감도와 미래도. 그럼에도 허망과 실망은 섣부른 여기는 쇼와昭和 92년, 이제는 퓨처 레트로를 힘겹게 그리는 시대, 쇠락할 구도舊都와 망할 것도 없는 마을을 지나 김빠지는 일렉펑크 속에서 간다, 한남.
어이쿠, 또 이곳이군.
비탈을 따라 휴식중인 카드섹션처럼 흐트러져 선 건물들, 더럽고, 우글거리는 다홍색 필라칸타 열매, 사진 촬영 금지, 예쁘다 만 것들 천지, 예쁘다 여기면 안 될 것 천지, 서정을 느끼려는 순간 솟아오르는 죄책감은 막아두고 걷는다 계속. 인근 주민들의 위생도 좀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사관 길이라니, 유엔빌리지에선 이곳이 보일까? 알 수 없으며 두어 번의 막다른 골목과 그곳에서 보이는 한강을 마주하며 잠시 멈춰 선다. 로드뷰엔 밤이 없고 그의 집도 찾을 수 없다. 도깨비 시장으로 간다.
음심 없이 이 비탈을 오르는 건 처음이구나! 음심만 있었을 뿐 도무지 좋은 기억이라고는 없는 이 동네를 표백하듯 복수하듯 밟아 오른다.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났던 길을 되짚어 오르막을 걷는다. 실수였다고, 후회를 바꿔 말하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실수였다 그를 만난 것은. 얼굴 없는 프로필이 궁금했을 뿐이었어 결국 별로였지 미친 그럼에도 나는 친절하고 싶었나봐 마음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방치해버렸을 뿐이었고. 그냥 실수, 나에게는. 그의 집을 나와 비탈을 내려가며 조금의 기쁨도 없었다. 객기 어린 뿌듯함—또 했네!—도 없었고 내가 망가지는 재미조차 없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나 끝내버렸고 그건 너무 당연해서 비난 받고 싶어지지만 그건 그저 싫은 기억일 뿐 추웠고 밝았고 의미 없었다.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풍경에 멀미를 참아가며 걷는다. 의도적으로 길을 잃는 속 보이는 문학적 짓을 나는 하지 않는다. 찾아질 수 없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의 과정은 필요 없다. 잔존하는 수치심을 되살려 즐길 생각도 없다. 그때도 지금도 겨울은 재앙이지만 나는 겨울에 꼭 이곳에 다시 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왜라는 이유 없이 와야만 했고, 앞으로도 왜는 없을 것이다. 이곳에 왜는 없으며 없다, 조금의 단서도 없어, 그 때문에 이곳으로 왔겠지만 그가 왜는 아니기에, 나는 그저 이곳이 무-의미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세 갈림길에서, 예상했듯, 나는 막다른다. 왜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이. 표백은커녕 빨기엔 애매한 얼룩만 생긴 채로 나는 돌아갈 테고 다시 돌아올 테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곳을 찾게 될 것이란 거짓 예감 속에 잠시 몸서리친다. 그러나 되짚어 되짚어 갈 것이고 반복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나를 억누를 테고 그런 내가 점점 더 무가치해지다 내가 알던 이곳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그해 겨울 역사驛舍에서 나는 참담했었는지 기뻤었는지. 다른 해보다 동파가 오천 건이나 더 많았다지 이 도시에. 플랫폼에 쭈그려앉아 엄마, 동백꽃도 볼 수 없는 이딴 도시에 내가 살아요, 모든 좋은 것들에서 멀어지고만 있다고 느끼면서, 동백도 없는 겨울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비참하기에만 좋을 겨울이라고. 눈이 없어도 온 시야가 하얗다고, 겨울의 흼은 과연 이런 것일 거라고, 나는 노트에 적어두었다.
삼거리에서, 오거리에서, 플랫폼에서
나는 내가 원하던 내가 되어 있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다. 기쁠 수는 없는 것이다, 암 그럼 안 되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던 내가 있던 내가 되고 싶지만 그것 역시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지나버렸고 저것은 못 될 것이며 서로 바라본 과거와 미래는 피차 어설프고 어색하며 앙상하고 터무니없이 불완전하다. 그저 상상의 반복일 뿐 황홀하고 맥빠진다. 그래서 잠시 근사해진다.
과거와 미래로는 갈 수 없지만 한남에는 갈 수 있다. 그래서 간다. 여전히 스크린 도어는 없고 나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그건 좋은 느낌에 훨씬 가깝다. 아마도 가까스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기대 속에서, 아무렴 다시 간다, 한남.